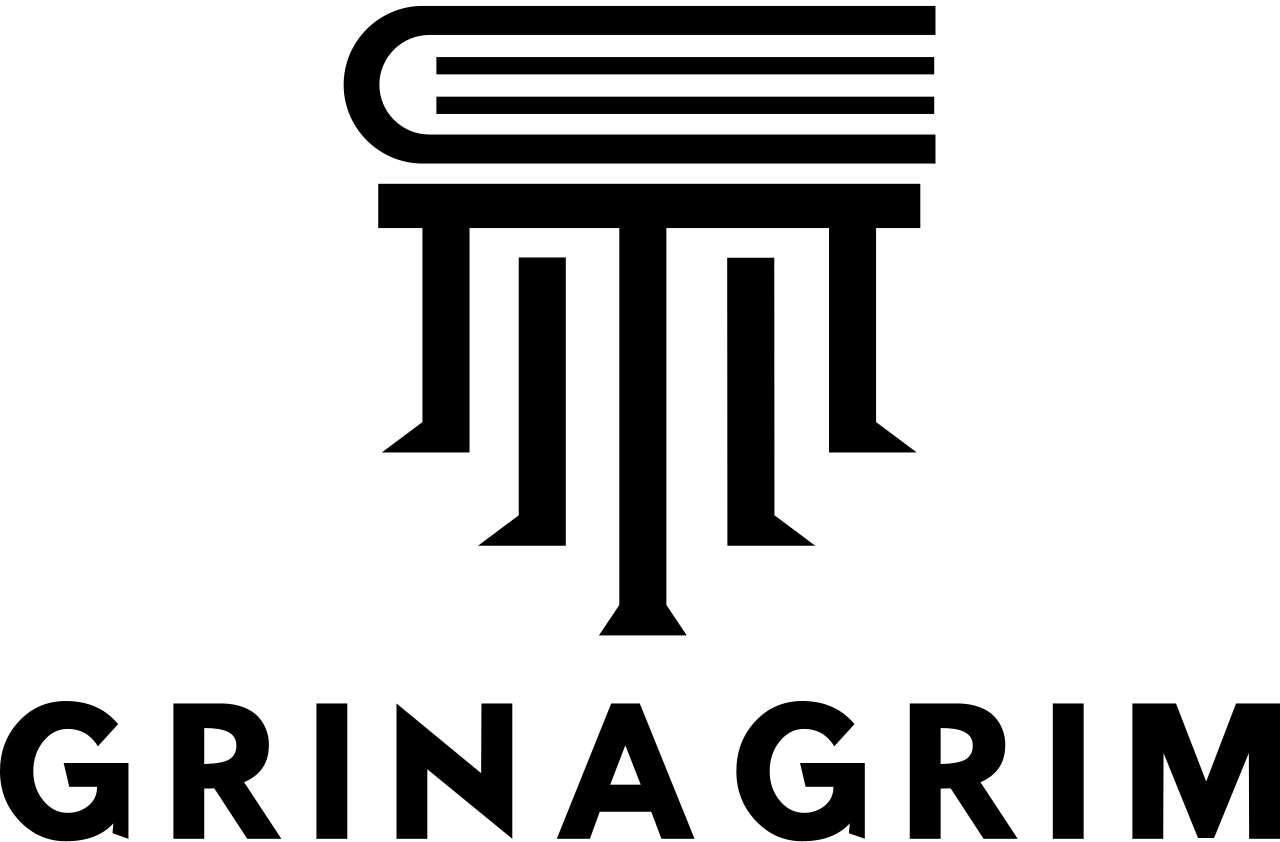'한국적인 것'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 듯하다.

요즘 유행하는 전시나 공간 디자인의 흐름을 보면, ‘비움’과 ‘절제’를 추구하며 텅 빈 화이트 큐브, 여백을 강조한 공간, 단색의 벽과 매끈한 선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김없이 ‘한국적인 것’이라는 수식이 따라붙는다.
우선 문화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해석의 틀로 작용해야 한다. 문화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대와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해석되고 재구성되는 것이다. ‘한국적인 것’ 역시 마찬가지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감지되는 감각의 경향을 말할 때 사용되어야지, 마치 처음부터 주어진 본질인 것처럼 다뤄줘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한국성’, ‘한국적인 것’을 미리 정해져 있는 미적 규범처럼 다뤄지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단순히 비워두고 절제된 선과 면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오브제를 미니멀하게 배치한 뒤 “이것이 한국적이다”라고 단정짓는 태도는 이러한 오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는 해석의 틀이지, 정체성을 고정하는 틀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칫 잘못하면 문화 DNA론, 근본주의와 같은 고정된 본질의 신화로 흐르기 쉽다. 문화는 선천적 본성이 아니라 역사 · 환경 · 사회적 조건이 오랜 세월에 걸쳐 종합적으로 축적된 경향이라는 것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적인 것'을 전시나 글로 표현할 때, 그 내용 자체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보통 ‘한국적’이라며 소개되는 전시를 보면 비움, 절제, 덜어내기를 기조로 공간을 구성하고 작품(특히 공예품)을 무의식적으로 떨궈놓듯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미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적인 경향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추구했던 미의식 혹은 서양의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한다.
앞서 말했듯 ‘한국적인 것’을 절대적 본질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역사적 경험과 생활환경의 축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감각의 경향성은 존재한다. 나는 그것을 인위성이 전제된 ‘비움’과 '빼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남겨둠’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비움과 절제를 목표로 한 일본의 미의식과 서양의 미니멀리즘 모두 인간 의지에 의한 통제와 정리가 전제되어 있다. 즉 인위성이 가미되었다는 의미다. 교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레산스이(枯山水)는 한 눈에 보기에 정갈하고 검소해 보인다. 하지만 자갈의 결을 내서 물결을 상징하도록 만들고 그 위에 무심한 듯 보이게 바위를 배치한 점 모두 인위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전통은 담장 밖의 풍경을 빌려서 내 정원으로 삼는 ‘차경(借景)’처럼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인위성을 최소화하며, 완결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특징이다.
요즘 특히 각광받는 백자 달항아리 역시 ‘비움의 미학’, ‘절제된 아름다움’ 등의 용어로 찬사를 보내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비운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형태와 색 그 자체를 인정한다는 데 매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대칭이 안맞고 한쪽으로 쏠린 형태와 굽는 과정에서 터진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를 싫어하고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좋아했다면 그 자리에서 깨버렸을테니 말이다. 우리가 백자 달항아리를 좋아하는 것은 결정된 형식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태도를 좋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옥 또한 마찬가지다. 일본 전통 건축의 매력은 내부에 있고, 그래서 사적이다. 정원은 중정처럼 안쪽으로 들어가야 마주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옥은 열린 구조에서 매력을 찾을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으며 대문만 열면 바로 정원을 구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연적인 통로, 최대한 남겨둠이 한옥 조성의 핵심이라는 데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회화의 여백은 동아시아 공통의 특징이긴 하지만 일본은 여백 부분을 금박으로 덮음으로써 회화의 주제인 모티프를 강조한 역사도 갖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본질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인위성을 최소화하여 단어 그대로 ‘남겨두는’ 게 보편적인 경향이었다.
이처럼 ‘비움’과 ‘절제’를 추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쓸고 닦고 다듬는 행위는 한국적이라기 보다는 일본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한다. 나도 전시를 준비하면서 절제된 화이트 큐브형 공간을 선호해왔고, 미니멀한 미감을 좋아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는 관람객이 작품 자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부차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곧 '한국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현재 '한국적 미학'이라 말하는 것은 종종 형식의 문제로 급하게 축소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을 가능하게 한 태도다. 자연스럽게 남겨두는 것을 선호한 미적 경향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재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일이다. 미니멀하게 보이는 형식을 ‘한국적’인 것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존중하는 사유를 회복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